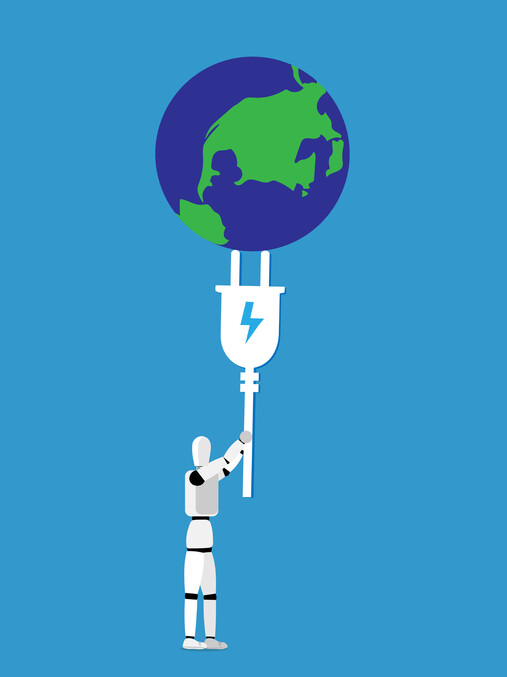

Q. 인공지능(AI) 개발·운영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챗지피티’, ‘제미나이’, 최근 ‘딥시크’까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은 기후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 불릴 만큼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만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인데, 이 추세는 앞으로 더욱 급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챗지피티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경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2년만 해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전력 사용량에서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는 핵심 시설인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1~1.5%로 추정했는데, 2024년에 이를 2%로 높였어요.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추정해요.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는 2022년 460테라와트시(TWh)에서 2026년 1000TWh로, 4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나 일본 전체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납니다. 챗지피티 출시 뒤인 2023년 구글은 1430만톤(이산화탄소환산)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3%, 2019년 대비론 48% 증가한 수치였어요.
이제 전 세계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은 데이터센터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껏 이들은 ‘탄소중립’(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등에 많은 투자를 해왔죠. 그런데 인공지능 산업이 뜨면서 점점 핵발전이나 소형모듈원전(SMR) 에 관심을 보여요.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내내 가동되어야 하므로 ‘간헐성’ 발전원 대신 전력이 끊길 걱정이 없는 핵발전을 쓰겠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쓰리마일섬 핵발전소 원자로 재가동을 요청했고, 아마존은 에스엠알 개발을 위해 에너지기업인 노스웨스트와 계약했어요.

물론 에너지저장체계(ESS)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의 발전원으로 쓰는 대안도 떠오르고 있어요. 태양이 떠 있고 바람이 불 때 전력을 생산해 배터리에 저장해 두고, 태양이 지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배터리에서 전력을 꺼내어 쓴다는 거죠. 지난해 구글은 미국 네바다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려 총 69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패널과 380㎿ 배터리를 결합한 발전소를 가동했어요. 아마존의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터센터도 총 450㎿의 태양광과 225㎿를 배터리를 결합한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애플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 조합을 활용해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부터 ‘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이 중국 석탄화력발전과 미국 신규 가스화력발전보다 저렴해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올해 전 세계적으로 80기가와트(GW)의 에너지저장체계가 전력망에 추가될 전망이예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저렴하고 화재 가능성이 낮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대규모로 제조된다고 하고요.
그러나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쓰더라도, 인공지능 서비스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감당하기 어려울 거에요. 이 때문에 “지구 생태계의 한계 안에서 인공지능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이달 초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폭증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지구 생태계의 수용 능력에 비춰 얼마나 적정한 규모인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지난해 아일랜드에서는 인공지능 지원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20%까지 폭증해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진 바 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이 사례를 들고, 당시 아일랜드 환경부 장관의 말을 빌려 “인공지능은 기후 한계 안에서, 안정적 전력망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생태계·기후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지속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어떤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국 국립공학정책센터의 경우 최근 발행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기반’ 제목의 보고서에서 △데이터센터의 ‘환경 보고 의무’ 확대 △‘데이터센터에 대한 환경 지속 가능성 요건’ 설정 등을 권고한 바 있어요.

또 김 연구위원은 ‘인공지능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합리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기후위기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원전은 1기를 짓는 데에만 15~20년이 걸리는 등 ‘가장 비싸고 가장 더딘 에너지’에 불과하단 것이죠. 게다가 전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이미 핵발전의 10배 수준이라, ‘재생에너지+배터리’라는 더 깨끗하고 미래지향적 해법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인공지능의 도약 목표만 세워놓고, 거기에 들어갈 에너지 충당 계획은 제대로 내놓지 않아 정책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고 짚었어요. 또 “‘디지털과 녹색이란 양 날개’로 균형 있게 국정 운영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최첨단 인공지능이라도 기후와 생태계의 한계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생태적 비전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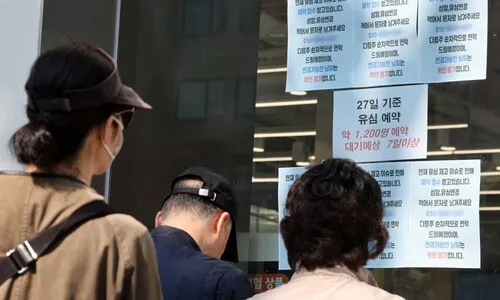


![[단독] 이재명 선대위 비서실장 이춘석·상황실장 강훈식 임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26/53_17456246432275_20250425503110.webp)













![[단독] 하루 7명의 노동자·군인·선원 숨지는 ‘재해 공화국’](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27/53_17457517911022_20250427502053.webp)






![광장의 함성 뒤, 다시 꺼내 읽는 ‘세월호, 그날의 기록’ [.txt]](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19/53_17450371823828_20250417504337.webp)





![검찰개혁 실패하자 내란이 왔다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57/154/imgdb/child/2025/0429/53_17459181996825_20250429503612.webp)



![<font color="#00b8b1">[뉴스 다이브] </font>김문수·한동훈 국힘 결선 진출..경선 총평과 명태균 핵폭탄 발언](https://img.hani.co.kr/imgdb/original/2025/0429/20250429502729.jpg)




![<font color="#FF4000">[단독]</font> 이재명 선대위 비서실장 이춘석·상황실장 강훈식 임명](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5/0426/53_17456246432275_20250425503110.webp)


